
ㅣ데일리포스트=김정은 기자ㅣ우리의 몸속에서 서식하며 공생하는 미생물은 본체인 인간이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체내 미생물이 사체 분해 과정에서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 제니퍼 드브루인(Jennifer DeBruyn) 미국 테네시대 교수가 호주 비영리 학술매체 '더컨버세이션'에 해설했다.
인체에는 수조 개에 달하는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음식의 소화 ▲필수 비타민 생성 ▲감염증으로부터의 보호 ▲기타 인간의 건강에 중요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많은 미생물이 집중된 장내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따뜻한 환경으로 안정적인 음식을 공급받을 수도 있다.
숙주인 인간이 사망하면 미생물들은 이전과 같은 환경에서 계속 살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드브루인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사체에 서식하는 미생물은 숙주가 죽은 후에도 부패한 사체에 서식하는 네크로바이옴(necrobiome) 형태로 사체 재활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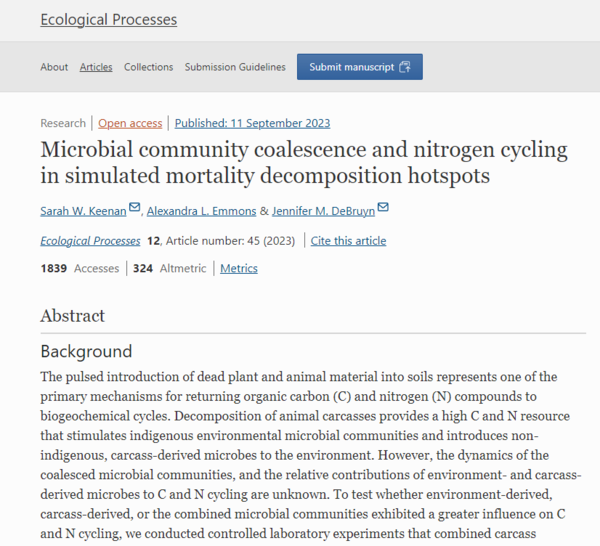
인간이 죽으면 심장은 혈액순환을 멈추고 산소를 잃은 세포는 효소를 통해 단백질·지질·당질 등을 분해하는 '자가분해(autolysis)' 과정을 시작한다. 숙주가 죽고 안정적인 음식 공급이 불가능해진 후, 자가분해에 의해 생산된 부산물은 공생하는 미생물에게 좋은 먹이가 된다.
또 장내 혐기성 세균((obligate anaerobe)은 사후 전신에 퍼져 '부패' 과정에서 안쪽부터 몸을 소화해 나간다. 혐기성 세균은 산소를 사용하지 않고 발효 등의 과정으로 에너지를 생성하기 때문에 분해 시 부패 냄새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드브루인 교수는 "진화적 관점에서 미생물이 죽어가는 몸에 적응하는 방법을 진화시킨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미생물이 기존 숙주를 버리고 콜로니(colony)를 형성할 새로운 숙주를 찾는 동안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시체의 탄소와 영양소를 이용하면 개체를 늘릴 수 있고, 개체 증가는 적어도 일부는 가혹한 환경에서 살아남아 새로운 몸을 찾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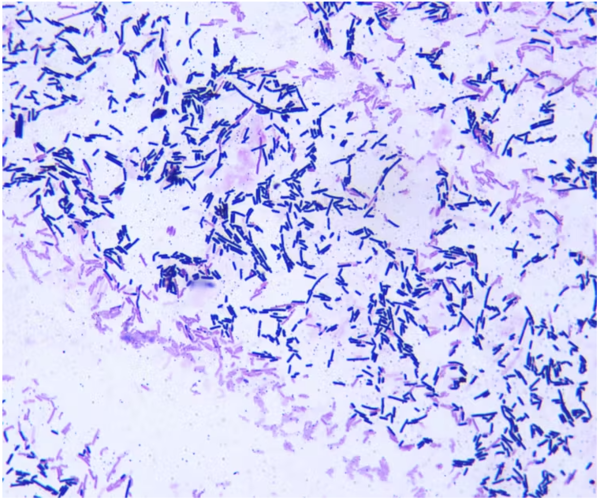
숙주가 죽은 미생물은 토양으로 방출돼,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기존 토양 미생물과 경쟁해야 한다. 체내와 비교해 토양은 상당히 가혹한 환경으로 여겨지지만, 기존 연구를 통해 숙주와 관련된 미생물 흔적은 부패한 사체 주위에서 수개월~수년에 걸쳐 계속 검출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팀은 미생물이 단순히 사체 주변 토양에 서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래 토양에 있던 미생물과 협력해 신체 분해를 촉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실제로 연구팀이 숙주 관련 미생물로 채워진 분해액과 토양을 혼합했더니 단순 토양에 비해 분해 속도가 향상될 뿐만 아니라, 생물에 필수적인 영양소인 질소의 순환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드브르인 교수는 "분해 미생물은 우리 몸속에서 농축된 영양이 풍부한 유기분자를, 다른 생물이 생명 유지를 위해 이용 가능한 보다 작고 생물학적으로 이용하기 쉬운 형태로 변환한다. 부패한 동물 근처에서 식물이 무성하게 자라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며, 체내 영양소가 생태계에 재사용되고 있다는 증거다. 미생물은 숙주의 사후에도 계속 살아간다"고 언급했다.

